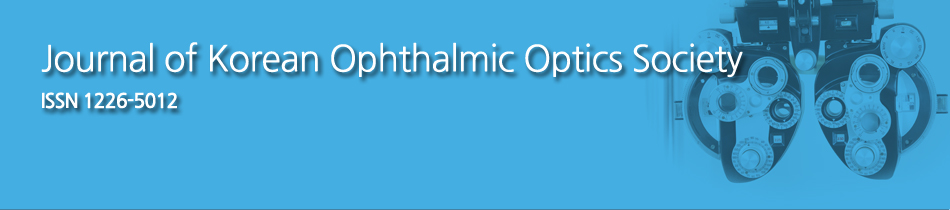| HOME | About JKOOS | Submission | Browse Archives |
Sorry.
You are not permitted to access the full text of articles.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permissions,
please contact the Society.
죄송합니다.
회원님은 논문 이용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 관련 문의는 학회로 부탁 드립니다.
Current Issue
| [ Article ] | |
| Journal of Korean Ophthalmic Optics Society - Vol. 28, No. 4, pp. 387-395 | |
| Abbreviation: J Korean Ophthalmic Opt Soc | |
| ISSN: 1226-5012 (Print) | |
| Print publication date 31 Dec 2023 | |
| Received 13 Dec 2023 Revised 17 Dec 2023 Accepted 18 Dec 2023 | |
| DOI: https://doi.org/10.14479/jkoos.2023.28.4.387 | |
| 한국 어린이의 근시 유병률과 근시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김정미* 
| |
| 극동대학교 안경광학과, 교수, 음성 27601 | |
The Prevalence of Myopia and the Factors Affecting Myopia Progression in Korean Children | |
Jeong-Mee Kim* 
| |
| Dept. of Visual Optics, Far East University, Professor, Eumseong 27601, Korea | |
| Correspondence to : *Jeong-Mee Kim, TEL: +82-43-880-3826, E-mail: kijeme@hanmail.net | |

| |
한국 어린이의 근시 유병률을 조사하고 근시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하였다.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총 16,703명(8.94±1.90세, 남: 54.8%, 여: 45.2%)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굴절이상은 조절마비제 사용없이 자동굴절검사기기(KR-8800)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5~12세 어린이의 근시 유병률은 55.6%였고, 어린이 근시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7~9세 연령(OR=1.67; 95% CI, 1.36-2.16; p<0.000), 10~12세 연령(OR=2.25; 95% CI, 1.66-3.10; p<0.000), 체질량지수(R=0.98; 95% CI, 0.9-0.99; p<0.000), 부모 모두 근시(OR=3.07; 95% CI, 2.86-3.29; p<0.000), 하루에 4시간 이상 근거리 작업 활동(OR=1.23; 95% CI, 1.15-1.33; p<0.000), 가장 높은 가계소득 그룹(OR=1.74, 95% CI, 1.55-1.96; p<0.000), 농촌 거주 (OR=0.87; 95% CI, 0.83-0.92; p<0.000)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 어린이의 근시 유병률은 글로벌 추세와 비교하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어린이의 근시 진행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연구의 결과는 어린이의 근시 진행을 완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한다.
To examine the prevalence of myopia and to evalu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progression of myopia in Korean children.
A total of 16,703 children (8.94±1.90 years, male: 54.8%, female: 45.2%) who participated in the 7th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were analyzed. Refractive error was determined with an auto-refractor-keratometer (KR-8800) without cycloplegia.
The prevalence of myopia in children, aged 5~12 years, was 55.6%. The factors influencing myopia progression in children included onset age between 7~9 years (OR=1.67; 95% CI, 1.36-2.16; p<0.000), onset age between 10~12 years (OR=2.25; 95% CI, 1.66-3.10; p<0.000), body mass index (R=0.98; 95% CI, 0.9-0.99; p<0.000), both parents with myopia (OR=3.07; 95% CI, 2.86-3.29; p<0.000), near-work activity for more than 4 hours per day (OR=1.23; 95% CI, 1.15-1.33; p<0.000), children from families with the highest household income (OR=1.74, 95% CI, 1.55-1.96; p<0.000), and those from rural residences (OR=0.87; 95% CI, 0.83-0.92; p<0.000).
The prevalence of myopia in Korean children was very high compared to the global trend. Myopia progression in children is expected to continue. The results suggest that effective methods to mitigate myopia progression in children should be the focus of much needed attention.
| Keywords: Children, Myopia, Myopia progression, Prevalence, Risk factor 키워드: 어린이, 근시, 근시 진행, 유병률, 위험 요인 |
|
근시는 최근 수 십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근시 유병률이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근시 유병률의 약 10%는 고도근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 근시 유병률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인구에서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으며,[2-6] 특히 이 지역의 어린이 근시 유병률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1] 우리나라의 경우 2008~2012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5~18세 근시 유병률은 약 65% 이상으로 보고되었고,[4,5] 현재 한국 어린이의 근시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 근시 발병 및 진행의 위험 요인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5,6]
근시의 조기 발병은 고도근시로 진행될 위험과 연관성이 있으며,[7,8] 고도근시는 성인이 된 이후에 망막박리, 녹내장, 백내장, 근시성 황반변성과 같은 병적인 안질환과 연관되어 돌이킬 수 없는 시력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9,10] Tideman 등은 급증하는 근시의 영향으로 2055년까지 근시의 고위험군에서 시각장애가 약 7배에서 13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1] 근시의 높은 유병률과 빠른 증가율은 근시 저교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또는 근시교정과 관리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은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될 수 있다.[9]
근시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에서 근시 진행의 병인 기전은 완전히 이해되지 않고 있지만, 근시의 유병률은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과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15]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높은 교육 성취도, 디지털기기 사용시간을 포함하는 근작업 활동의 증가, 야외에서 보내는 제한된 시간 등의 환경 및 생활 방식 요인이 근시 유병률의 빠른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많은 연구에서 뒷받침하고 있다.[16-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 어린이의 근시 유병률을 조사하고 근시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16~2017년)(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VII) 에 참여한 5~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굴절이상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사시 또는 안검하수 등과 같은 안과 수술 경력이 있는 어린이, 누락된 부모의 근시 여부 데이터를 제외시켜 최종적으로 16,703명을 분석하였다. 사회 인구학적 변수와 안과 병력은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되었고 체질량지수(body mall index, BMI)는 체중(kg)/키(m)2로 계산하였다. 또한 어린이에 이어서 청소년의 근시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자 15,366명이 포함되었다.
2016~2017년에는 생명윤리법에 의해 국가가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직접 수행하는 연구는 연구윤리위원회의심의를 받지 않고 수행되어 KNHANES VII(2016~2017)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없이 수행되었다.
양안의 굴절이상은 조절마비제의 사용 없이 자동굴절검사기(KR-8800, Topcon,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굴절이상은 등가구면굴절력(SE)을 계산하여 오른쪽 눈의 SE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고, SE 값에 따라 5~12세 어린이의 굴절이상 상태를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근시안 SE≤−0.50D, 고도 근시안 SE≤−6.00D, 원시안 SE≥+0.75D, 정시안 −0.50D<SE<+0.75D. 청소년(13~18세)의 경우는 근시안 SE≤−0.50D, 고도 근시안 SE≤−6.00D, 원시안 SE≥+0.50D, 정시안 −0.50D<SE<+0.50D 기준으로 굴절이상 상태를 분류하였다.
데이터의 통계처리는 SAS(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9.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술통계는 평균±표준편차(SD)와 빈도로 제시하였고, 범주형 데이터에 대한 근시와 비근시의 비교는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 나머지 변수에 대한 두 그룹 비교는 공분산분석(ANCOVA 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오즈비(adjusted dds ratio)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분석하여 근시와 관련된 독립적인 위험 요인을 결정하는데 사용하였다. 모든 데이터 분석 결과의 통계적 유의 수준은 p<0.05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12세 어린이 16,703명(남자; 52.5%, 여자; 47.5%)을 분석하였고, 근시 유병률은 55.6%로 나타났다. 어린이의 평균 나이는 8.94±1.90였고, 근시 그룹의 어린이 나이는 정시와 원시를 포함하는 비근시그룹의 어린이 나이보다 높았다(p<0.000). 근시의 평균 SE는 −2.55±1.58, 비근시의 평균 SE는 +0.30±0.80으로 나타났다. 체질량지수인 BMI는 비근시 그룹과 비교하여 근시 그룹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p<0.000)(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ged 5~12 years, with and without myopia
| Total | Myopia | Non-myopia | p-value | |
|---|---|---|---|---|
| Number (%) | 16,703 | 9,286 (55.6%) | 7,417 (44.4%) | |
| Age (years) | 8.94±1.901) | 9.46±1.80 | 7.96±1.81 | <0.000 |
| Gender, n (%) | <0.000 | |||
| Male | 8,775 (52.5%) | 5,947 (54.8%) | 2,828 (48.3%) | |
| Female | 7,928 (47.5%) | 4,895 (45.2%) | 3,033 (51.7%) | |
| Refractive error (SE*) (D) | −1.57±1.89 | −2.55±1.58 | +0.30±0.80 | <0.000 |
| BMI** (kg/m2) | 17.46±2.96 | 17.77±2.92 | 16.35±2.57 | <0.000 |
어린이와 청소년의 굴절이상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Table 3으로 나타냈다. 전체(5~18세) 근시 유병률은 70.0%였고, 고도근시는 9.8%를 차지했다. 어린이와 청소년 그룹으로 각각 나누면 어린이(5~12세)의 근시 유병률은 55.6%(고도근시 2.2%), 청소년(13~18세)의 근시 유병률은 85.2%(고도근시 14.7%)로 나타났다. 어린이의 나이를 세분화하여 분석한 근시 유병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한 증가를 보인 반면 청소년의 근시 유병률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근시의 SE 값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5~6세에서 정시안은 61.2%를 나타냈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전체 정시안은 25.4%를 차지하였다. 원시 상태는 5~6세 인 경우 제일 높은 11.6%를 보이고 나이가 증가하면서 점점 감소하여 우리나라 어린이 및 청소년의 원시안은 전체 4.6%로 나타났다(Fig. 1).
The prevalence of refractive status in 5~18-year-old participants by age grouping
| Age group (years) |
Myopia | Emmetropia | Hyperopia | p-value |
|---|---|---|---|---|
| 5~6 | 27.2% (n=1,205) | 61.2% (n=2,709) | 11.6% (n=512) | <0.000 |
| 7~9 | 56.9% (n=3,530) | 35.6% (n=2,210) | 7.5% (n=465) | <0.000 |
| 10~12 | 74.9% (n=4,551) | 22.2% (n=1,347) | 2.9% (n=174) | <0.000 |
| 5~12 | 55.6% (n=9,286) | 37.5% (n=6,266) | 6.9% (n=1,151) | <0.000 |
| 13~15 | 84.0% (n=7,670) | 13.7% (n=1,253) | 2.3% (n=213) | <0.000 |
| 16~18 | 87.1% (n=5,427) | 11.0% (n=685) | 1.9% (n=119) | <0.000 |
| 13~18 | 85.2% (n=13,097) | 12.6% (n=1,938) | 2.2% (n=332) | <0.000 |
| Total | 70.0% (n=22,383) | 25.4% (n=8,204) | 4.6% (n=1,483) | <0.000 |
The mean spherical equivalent of refractive error in 5~18-year-old participants by age grouping
| Age group (years) |
Myopia | High myopia | Emmetropia | Hyperopia | p-value |
|---|---|---|---|---|---|
| Mean±SD* (SE**) (D) | |||||
| 5~6 | −0.79±1.02 | - | +0.10±1.01 | +2.15±0.23 | <0.000 |
| 7~9 | −2.08±1.35 | −6.24±1.21 | +0.03±0.20 | +1.60±0.18 | <0.000 |
| 10~12 | −2.89±1.58 | −6.27±1.26 | −0.04±0.15 | +2.43±0.15 | <0.000 |
| 13~15 | −3.06±1.59 | −7.49±1.22 | −0.03±0.14 | +0.98±0.21 | <0.000 |
| 16~18 | −3.25±1.58 | −7.55±1.25 | −0.16±0.13 | +1.04±0.19 | <0.000 |

Fig. 1.
The prevalence of refractive status in 5~18-year-old participants by age grouping.
따라서, 어린이의 근시 유병률은 55.6%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정시는 37.5%, 원시 상태의 어린이는 6.9%로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근시 유병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히 증가한 반면, 정시 및 원시 어린이의 비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이러한 나이에 따른 굴절력의 변화 추세는 다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22,23] 영유아기 및 아동기 동안의 원시량은 원시 예비량으로 생리적 원시로 정의되며 이러한 원시량은 6세 이후 느린 속도로 정시화 과정이 계속 진행되면서 점점 감소하게 된다.[24] 원시 예비량의 부족은 향후 근시 형성의 예측 인자로 잠재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22,25] 본 연구에서 분석한 2016~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5~6세의 근시 유병률은 27.2%에서 시작하여 13~18세의 근시 유병률이 85.2%로 나타났고, Rim 등에 의한 2008~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에 의한 5~6세의 근시 유병률은 13.2%에서 12~18세의 근시 유병률 73.0%[6]와 비교하면 이 연령대의 근시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굴절력의 범위를 −0.50D<SE<+0.75D로 정의한 정시 어린이 그룹은 향후 근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근시 전 단계에 놓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그룹이다. 근시 유병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대치가 높아 어릴 때부터 학습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취학 전 아동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근시 발병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21,26] 근시 유병률이 높은 우리나라 어린이도 교육 요구도가 높아 이러한 현상은 예측 가능하다. 따라서 어린이의 생애 초기는 시력 발달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특정 연령대의 근시 유병률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근시 유병률은 유전적, 환경적, 생활 방식 요인으로 인해 지역 및 인구 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한국 어린이의 유병률과 글로벌 추세를 비교하는 것은 특정 인구통계에서 근시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한 요인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전 세계적으로 근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국가 또는 인종, 어린이 연령대별로 어린이 근시 유병률은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남아메리카에 위치하는 파라과이 어린이(5~16세)의 근시 유병률은 1.4%인 반면 원시 유병률은 40% 이상으로 나타났다.[27] 프랑스 어린이(0~9세)의 근시 유병률은 19.6%였고,[28] 베이징, 홍콩,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 지역에서 6~8세 아동의 근시 유병률은 약 18~35%로 나타났다.[23,29,30] 또한, 일본의 도쿄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한 곳에서 조사한 초등학생(8~10세)의 근시 유병률은 약 77%(고도근시 4%)로 보고되었다.[31] Grzybowski 등에 의해 2013~2019년도 사이의 어린이 근시 유병률을 정리한 연구에서, 한국, 중국, 싱가포르를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도시지역 어린이의 근시 유병률은 약 73%, 유럽 지역은 40%, 북아메리카 지역은 42%를 보인 반면,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지역의 어린이 근시 유병률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32] 한편, 흥미롭게도 약 140년(1882~2018년)에 걸친 전체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덴마크의 근시 연구를 평가한 결과에서는 근시 유병률에 대한 설득력 있는 변화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는 일부 지역에서 보고된 높은 근시 유병률과 WHO에서 예측한 근시 증가 예상과는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33]
Dong 등에 따르면 1998~2016년 기간 동안의 중국 청소년의 근시와 관련된 메타분석 결과에서 16~18세의 근시와 고도근시 유병률은 각각 56%와 15%로 나타났고, 2013년 이후에서 16~18세의 근시와 고도근시 유병률은 각각 약 85%와 19%로 증가한 결과가 나타났다.[34] 본 연구에서 한국 청소년의 근시 유병률은 약 85%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16~18세 청소년의 근시와 고도근시 유병률은 각각 약 87%와 16%였다. 또한 청소년의 나이 증가에 따른 근시 유병률의 큰 변화는 없었지만 근시의 굴절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근시가 청소년기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이전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7,35-37] 16~18세 한국 청소년의 근시와 고도근시 유병률은 Dong 등에 의한 메타분석 결과인 중국의 청소년 근시와 고도근시 유병률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고도 근시 유병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은 향후 성인 근시안의 비가역적 시력 상실의 위험 요인으로 고도근시가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어린이의 지속적인 근시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어린이의 근시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나이와 성별이 조정된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에서, 나이, 체질량지수, 부모의 근시, 근거리 활동 및 작업 시간, 가계 수입, 거주 지역 등의 요인들은 어린이 근시와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였다(Table 4). 어린이의 나이가 증가하면서 근시 위험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9세에서 어린이의 근시 위험은 1.67배(95%CI, 1.36-2.16; p<0.000) 증가, 10~12세의 근시 위험은 2.25배 (95%CI, 1.66-3.10; p<0.000) 증가하였다. 체질량지수의 근시 위험은 0.98배 나타났고(95% CI, 0.9-0.99; p<0.000), 부모 모두 근시인 경우 자녀의 근시 위험은 3.07배(95% CI, 2.86-3.29; p<0.000) 증가하였고, 근거리 작업 활동은 하루에 4시간 이상 활동을 한 경우 근시 위험은 1.23배(95% CI, 1.15-1.33; p<0.00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소득을 4분위수로 분류하였을 때 가장 높은 소득 그룹은 근시 위험이 1.74배(95% CI, 1.55-1.96; p<0.000) 증가하였다. 도시보다 농촌에서 거주하는 경우 근시 위험은 0.87배(95% CI, 0.83-0.92; p<0.00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the risk factors for myopia in children aged 5~12 years
| Adjusted OR1)* [95% CI**] | p-value | |
|---|---|---|
| Gender | ||
| Female | 0.96 [0.94, 1.01] | 0.105 |
| Age (years) | ||
| 10~12 | 2.25 [1.66, 3.10] | <0.000 |
| BMI*** (kg/m2) | 0.98 [0.97, 0.99] | <0.000 |
| Parental myopia | ||
| Both parents | 3.07 [2.86, 3.29] | <0.000 |
| Near work | ||
| ≥4 h/day | 1.23 [1.15, 1.33] | <0.000 |
| Household income | ||
| Highest quartile | 1.74 [1.55, 1.96] | <0.000 |
| Residence | ||
| Rural | 0.87 [0.83, 0.92] | <0.000 |
본 연구에서 어린이의 근시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요인은 나이, 체질량지수, 부모 근시의 가족력, 근거리 작업 활동 시간, 경제적 상태, 주거 지역 등으로 나타났고, 특히, 10~12세 연령대 요인과 부모 모두가 근시인 경우 어린이의 근시 위험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어린이 성별은 근시 유병률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근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근시 위험 요소는 나이, 여아 근시, 부모 근시, 교육적 압박으로 인한 공부 시간의 증가와 야외 활동 시간의 감소, 짧은 근작업 거리, 도시 주거 등이 포함되었으며,[23,26,38-41]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전자기기의 사용과 체질량지수가 잠재적인 근시 위험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42-46] 현대사회의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많은 환경적 요인이 동시에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교육 수준, 가족 소득, 인구 밀도의 변화, 주택 유형, 식습관 및 생활 방식과 같은 생활 환경이 포함되며, 이러한 환경과 매우 밀접한 후천적 요인들이 근시 유병률의 빠른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1] 따라서, 학령기 어린이의 근시 발생 및 진행을 낮추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간을 늘리고 디지털기기 사용 시간을 포함한 근거리 활동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19,47,48]
어린이의 근시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경제적 부담 상승과 함께 글로벌 공중 보건의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제한된 실내 공간에서 생활은 특히, 어린이 근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야외에서 생활 금지, 근거리 활동 증가, 스크린 사용시간 증가 등..)에 강제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코로나19 동안 어린이의 근시 발병 및 진행과 관련된 많은 연구 문헌에서 코로나 기간의 생활 방식이 근시 유병률의 증가에 기여했다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49-53] 홍콩의 6~8세 아동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발병 초기에 모집되어 약 8개월 추적 관찰한 종단 코호트 연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어린이의 야외활동 시간은 1일 기준 1.27시간에서 0.41시간으로 감소하였고, 스크린 사용 시간은 1일 기준 2.45시간에서 6.89시간으로 증가 하였으며, SE와 안축 길이의 변화는 각각 −0.50D와 0.29 mm으로 나타나 어린이의 근시 발생률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49] 중국 초등학생(6~13세)을 대상으로 6년 연속(2015~2020년) 학교에서 수행된 시력검사를 기반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자택 격리 기간 동안 학령기 아동의 굴절력과 근시 유병률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2020년 시력 검진에서 6~8세 어린이의 SE 값이 전년도(2015~2019년)와 비교하여 약 −0.3D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근시 유병률은 6세(21.5% 대 5.7%), 7세(26.2% 대 16.2%), 8세(37.2% 대 27.7%)에서는 전년도(2015~ 2019년)보다 증가하였으나, 9~13세 어린이 그룹에서는 SE와 근시 유병률의 변화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미미하였다고 보고하였다.[50] 중동지역의 튀르키에 연구에서는 근시 진단을 받고 최소 3년 이상 추적 관찰된 8~17세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 기간 동안의 근시 변화량을 분석하였다. 코로나19 전의 연평균 근시 진행 SE 값은 2017년, 2018년, 2019년에 각각 0.49D, 0.41D, 0.54D였으나, 코로나 기간인 2020년에는 근시 진행이 0.71D로 나타났다.[51] 인도 연구에서는 6개월에서 1년 전에 최소 두 번 이상 굴절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는 SE −0.5D 이하의 근시를 가진 6~18세의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근시 진행 속도를 비교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에는 11% 정도가 연간 1D 이상의 근시 진행을 보인 반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전체 참여자의 46%가 연간 1D 이상의 근시 진행을 나타냈고, 하루 1시간 미만의 햇빛 노출이 급속한 근시 진행의 독립적인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52] 또한, 홍콩의 코로나19 이전, 코로나 기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홍콩 어린이(6~8세) 근시 유병률을 포괄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더 어릴수록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근시 발병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홍콩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제한이 해제된 후 어린이들의 근시 유병률이 팬데믹 이전보다 증가하였으며, 생활 방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53]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인구 집단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 근시 유병률을 조사한 데이터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한국 어린이의 근시 유병률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측 가능하고 어린이 근시 유병률의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근시는 굴절이상을 교정하여 원거리 시력을 개선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교정 방법은 안경, 콘택트렌즈 또는 굴절교정수술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근시가 발병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근시 진행이 이루어져 고도근시 상태가 되면 젊은 성인의 경우 망막박리와 같은 병적 안질환을 동반할 수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기 백내장, 녹내장, 근시성 황반변증과 같은 안구 병리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8-10] 고도근시인 사람은 정시안보다 일생 동안 망막 박리가 발생할 확률이 20배 더 높고,[54] 돌이킬 수 없는 망막 위축을 동반한 고도근시로 정의되는 병적 근시는 백인의 경우는 약 1% 정도이고, 아시아인의 경우는 1~3%에 해당된다고 한다.[55] 비가역적 시력 상실의 가장 큰 근시 관련 원인은 근시성 황반병증이다.[56-58] 이러한 시력을 위협하는 망막 변화는 노년기에 발생하지만, 근본적인 근시는 어린 시절에 발생하고 21세가 되면 안정화되는 경우가 많지만,[59] 일부 근시 환자의 경우 어린 나이에도 근시성 황반병증으로 인한 시력 상실을 피할 수 없다.[9] 근시성 황반변성의 위험성은 고도근시인 −6D 이상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다른 일반적인 안질환과 달리 근시성 황반병증은 치료가 불가능하다.[60] Bullimore 등의 연구에 따르면, 근시가 1D 증가할 때마다 근시성 황반병증 발생률이 평생을 걸쳐 67%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서, 근시의 굴절이상을 1D 낮추는 것은 근시성 황반병증의 발병 가능성을 인종이나 근시 정도에 관계없이 4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60] 이처럼 어린 나이의 조기 근시 발병과 근시 진행 정도는 성인기의 시력 건강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린이의 근시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5~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굴절이상 상태를 분석하여 근시 유병률과 근시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어린이 근시 유병률은 글로벌 추세와 비교하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근시 유병률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의 높은 근시 유병률을 고려하면, 어린이의 근시 진행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어린이의 근시 발생 및 진행과 관련 있는 위험 요소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및 생활 방식 모두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어린이의 빠른 근시 진행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근시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어린이의 근시 진행을 완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싶다.
References
| 1. | Holden BA, Fricke TR, Wilson DA, et al. Global prevalence of myopia and high myopia and temporal trends from 2000 through 2050. Ophthalmology. 2016;123(5): 1036-1042. |
| 2. | Saw SM. A synopsis of the prevalence rates and environmental risk factors for myopia. Clin Exp Optom. 2003;86(5):289-294. |
| 3. | Morgan IG, Ohno-Matsui K, Saw SM. Myopia. The Lancet. 2012;379(9827):1739-1748. |
| 4. | Lim DH, Han J, Chung TY, et al. The high prevalence of myopia in Korean children with influence of parental refractive errors: the 2008-2012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PLoS ONE. 2018;13(11):e0207690. |
| 5. | Yoon KC, Mun GH, Kim SD, et al. Prevalence of eye disease in South Korea: data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8~2009. Korean J Ophthalmol. 2011;25(6):421-433. |
| 6. | Rim TH, Kim SH, Lim KH, et al. Refractive errors in Koreans: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8-2012. Korean J Ophthalmol. 2016;30(3):214-224. |
| 7. | Hu Y, Ding X, Guo X, et al. Association of age at myopia onset with risk of high myopia in adulthood in a 12-year follow-up of a Chinese cohort. JAMA Ophthalmol. 2020;138(11):1129-1134. |
| 8. | Chua SYL, Sabanayagam C, Cheung YB, et al. Age of onset of myopia predicts risk of high myopia in later childhood in myopic Singapore children. Ophthalmic Physiol Opt. 2016;36(4):388-394. |
| 9. | Bourke CM, Loughman J, Flitcroft DI, et al. We can’t afford to turn a blind eye to myopia. QJM. 2023;116(8): 635-639. |
| 10. | Verkicharla PK, Ohno-Matsui K, Saw SM. Current and predicted demographics of high myopia and an update of its associated pathological changes. Ophthalmic Physiol Opt. 2015;35(5):465-475. |
| 11. | Tideman JWL, Snabel MCC, Tedja MS, et al. Association of axial length with risk of uncorrectable visual impairment for Europeans with myopia. JAMA Ophthalmol. 2016;134(12):1355-1363. |
| 12. | Hammond CJ, Snieder H, Gilbert CE, et al. Genes and environment in refractive error: the twin eye study. Investig Ophthalmol Vis Sci. 2001;42(6):1232-1236. |
| 13. | Rose KA, Morgan IG, Smith W, et al. Myopia, lifestyle, and schooling in students of Chinese ethnicity in Singapore and Sydney. Arch Ophthalmol. 2008;126(4):527-530. |
| 14. | Pacella R, McLellan J, Grice K, et al. Role of genetic factors in the etiology of juvenile-onset myopia based on a longitudinal study of refractive error. Optom Vis Sci. 1999;76(6):381-386. |
| 15. | Harb EN, Wildsoet CF. Origins of refractive errors: environmental and genetic factors. Annu Rev Vis Sci. 2019;5:47-72. |
| 16. | Wu PC, Chen CT, Lin KK, et al. Myopia prevention and outdoor light intensity in a school-based cluster randomized trial. Ophthalmology. 2018;125(8):1239-1250. |
| 17. | Rose KA, Morgan IG, Ip J, et al. Outdoor activity reduces the prevalence of myopia in children. Ophthalmology. 2008;115(8):1279-1285. |
| 18. | Dirani M, Tong L, Gazzard G, et al. Outdoor activity and myopia in Singapore teenage children. Br J Ophthalmol. 2009;93(8):997-1000. |
| 19. | Ramamurthy D, Lin Chua SY, Saw SM. A review of environmental risk factors for myopia during early life, childhood and adolescence. Clin Exp Optom. 2015;98(6): 497-506. |
| 20. | Dragomirova M, Antonova A, Stoykova S, et al. Myopia in Bulgarian school children: prevalence, risk factors, and health care coverage. BMC ophthalmol. 2022;22(1):1-9. |
| 21. | Jong M, Naduvilath T, Saw J, et al. Association between global myopia prevalence and international levels of education. Optom Vis Sci. 2023;100(10):702-707. |
| 22. | Yue Y, Liu X, Yi S, et al. High prevalence of myopia and low hyperopia reserve in 4411 Chinese primary school students and associated risk factors. BMC Ophthalmol. 2022;22(1):1-9. |
| 23. | Lyu Y, Zhang H, Gong Y, et al. Prevalence of and factors associated with myopia in primary school students in the Chaoyang District of Beijing, China. Jpn J Ophthalmol. 2015;59(6):421-429. |
| 24. | Flitcroft D. Emmetropisation and the aetiology of refractive errors. Eye. 2014;28(2):169-179. |
| 25. | Zadnik K, Sinnott LT, Cotter SA, et al. Prediction of juvenile-onset myopia. JAMA Ophthalmol. 2015;133(6):683-689. |
| 26. | Morgan IG, Rose KA. Myopia and international educational performance. Ophthalmic Physiol Opt. 2013;33(3): 329-338. |
| 27. | Carter MJ, Lansingh VC, Schacht G, et al. Visual acuity and refraction by age for children of three different ethnic groups in Paraguay. Arq Bras Oftalmol. 2013;76(2):94-97. |
| 28. | Matamoros E, Ingrand P, Pelen F, et al. Prevalence of myopia in France: a cross-sectional analysis. Medicine. 2015;94(45):e1976. |
| 29. | Yam JC, Tang SM, Kam KW, et al. High prevalence of myopia in children and their parents in Hong Kong Chinese population: the Hong Kong children eye study. Acta Ophthalmol. 2020;98(5):639-648. |
| 30. | Ding BY, Shih YF, Lin LLK, et al. Myopia among schoolchildren in East Asia and Singapore. Surv Ophthalmol. 2017;62(5):677-697. |
| 31. | Yotsukura E, Torii H, Inokuchi M, et al. Current prevalence of myopia and association of myopia with environmental factors among schoolchildren in Japan. JAMA Ophthalmol. 2019;137(11):1233-1239. |
| 32. | Grzybowski A, Kanclerz P, Tsubota K, et al. A review on the epidemiology of myopia in school children worldwide. BMC Ophthalmol. 2020;20(1):27. |
| 33. | Hansen MH, Hvid-Hansen A, Jacobsen N, et al. Myopia prevalence in Denmark-a review of 140 years of myopia research. Acta Ophthalmol. 2021;99(2):118-127. |
| 34. | Dong L, Kang YK, Li Y, et al. Prevalence and time trends of myopia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China: a systemic review and meta-analysis. Retina. 2020;40(3):399-411. |
| 35. | Lee SSY, Lingham G, Sanfilippo PG, et al. Incidence and progression of myopia in early adulthood. JAMA Ophthalmol. 2022;140(2):162-169. |
| 36. | Bullimore MA, Lee SSY, Schmid KL, et al. IMI-onset and progression of myopia in young adults. Investig Ophthalmol Vis Sci. 2023;64(6):2. |
| 37. | Zhu Z, Chen Y, Tan Z, et al. Interventions recommended for myopia prevention and control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in China: a systematic review. Br J Ophthalmol. 2023;107(2):160-166. |
| 38. | Guo Y, Duan JL, Liu LJ, et al. High myopia in greater Beijing school children in 2016. PLoS ONE. 2017;12(11): e0187396. |
| 39. | Lim LT, Gong Y, Ah-Kee EY, et al. Impact of parental history of myopia on the development of myopia in mainland China school-aged children. Ophthalmol Eye Dis. 2014;6:31-35. |
| 40. | Guo L, Yang J, Mai J, et al. Prevalence and associated factors of myopia among primary and middle school-aged students: a school-based study in Guangzhou. Eye. 2016;30(6):796-804. |
| 41. | Morgan IG, French AN, Ashby RS, et al. The epidemics of myopia: aetiology and prevention. Prog Retin Eye Res. 2018;62:134-149. |
| 42. | Wang J, Li M, Zhu D, et al. Smartphone overuse and visual impairment in children and young adults: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 Med Internet Res. 2020;22(12):e21923. |
| 43. | Foreman J, Salim AT, Praveen A, et al. Association between digital smart device use and myopia: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Lancet Digit Health. 2021;3(12):806-818. |
| 44. | Xie Z, Long Y, Wang J, et al. Prevalence of myopia and associated risk factors among primary students in Chongqing: multilevel modeling. BMC Ophthalmol. 2020;20(1): 146. |
| 45. | Ye S, Liu S, Li W, et al. Associations between anthropometric indicators and both refraction and ocular biometrics in a cross-sectional study of Chinese schoolchildren. BMJ Open. 2019;9(5):e027212. |
| 46. | Du W, Ding G, Guo X, et al. Associations between anthropometric indicators and refraction in school-age children during the post-COVID-19 era. Front Public Health. 2023;10:1059465. |
| 47. | He M, Xiang F, Zeng Y, et al. Effect of time spent outdoors at school on the development of myopia among children in China: a randomized clinical trial. JAMA. 2015;314(11):1142-1148. |
| 48. | Wu PC, Tsai CL, Wu HL, et al. Outdoor activity during class recess reduces myopia onset and progression in school children. Ophthalmology. 2013;120(5):1080-1085. |
| 49. | Zhang X, Cheung SSL, Chan HN, et al. Myopia incidence and lifestyle changes among school childre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population-based prospective study. Br J Ophthalmol. 2022;106(12):1772-1778. |
| 50. | Wang J, Li Y, Musch DC, et al. Progression of myopia in school-aged children after COVID-19 home confinement. JAMA Ophthalmol. 2021;139(3):293-300. |
| 51. | Aslan F, Sahinoglu-Keskek N. The effect of home education on myopia progression in childre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ye. 2022;36(7):1427-1432. |
| 52. | Mohan A, Sen P, Peeush P, et al. Impact of online classes and home confinement on myopia progression in children during COVID-19 pandemic: digital eye strain among kids (DESK) study 4. Indian J Ophthalmol. 2022;70(1): 241-245. |
| 53. | Zhang XJ, Zhang Y, Kam KW, et al. Prevalence of myopia in children before, during, and after COVID-19 restrictions in Hong Kong. JAMA Netw Open. 2023;6(3): e234080. |
| 54. | Wu PC, Chuang MN, Choi J, et al. Update in myopia and treatment strategy of atropine use in myopia control. Eye. 2019;33(1):3-13. |
| 55. | Dhakal R, Goud A, Narayanan R, et al. Patterns of posterior ocular complications in myopic eyes of Indian population. Sci Rep. 2018;8(1):13700. |
| 56. | Hsu WM, Cheng CY, Liu JH, et al. Prevalence and causes of visual impairment in an elderly Chinese population in Taiwan: the Shihpai eye study. Ophthalmology. 2004;111(1): 62-69. |
| 57. | Iwase A, Araie M, Tomidokoro A, et al. Prevalence and causes of low vision and blindness in a Japanese adult population: the Tajimi study. Ophthalmology. 2006;113(8): 1354-1362. |
| 58. | Liang YB, Friedman DS, Wong TY, et al. Prevalence and causes of low vision and blindness in a rural Chinese adult population: the Handan eye study. Ophthalmology. 2008;115(11):1965-1972. |
| 59. | COMET Group. Myopia stabilization and associated factors among participants in the correction of myopia evaluation trial(COMET). Investig Ophthalmol Vis Sci. 2013;54(13):7871-7884. |
| 60. | Bullimore MA, Brennan NA. Myopia control: why each diopter matters. Optom Vis Sci. 2019;96(6):463-465. |
 Copyright statement 2015, The Korean Ophthalmic Optics Society,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statement 2015, The Korean Ophthalmic Optics Society, All rights reserved.Department of Optometry, Dongkang Colleg., 50, Dongmun-daero, Buk-gu, Gwangju, Republic of Korea
TEL: 82-62-520-3241 | FAX 82-62-520-3244 | ophthalmicoptics@outlook.com